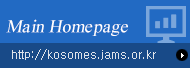1. 서 론
선박의 선장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시 운항을 정지하는 경우인 정류는 실무에서 흔한 일이다. 정류의 목적에는 도선사 승선시간 또는 항만 스케쥴에 따른 대기 등이 있다. 이러한 정류 중인 선박의 법적 지위는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COLREG)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자들의 입장과 판례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정류 중인 선박은 단순히 대수속력이 없는 항행중인 동력 선이고, 다른 선박은 외관상 정류 중인 선박을 식별할 방법이 없다.
또한 정류 중인 선박은 정침성이 없고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반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피항선, 유지선의 관계 성립도 모호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항해안전에 위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정류 중인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 선박이 외관상 정류 중인 선박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류 중인 선박의 법적 지위 검토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부에서 정류 중인 선박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AIS 활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정류 중인 선박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항해·통신장비를 활용하여 항해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 정류 중인 선박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선행연구는 Kim(2002), Lim(2016)이 있다. 해당 연구들에서는 정류 중인 선박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정리하고 선박에 특성에 따른 항법상 지위. 즉, 정류 중인 선박에게 일반항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선원의 상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논문들은 정류중인 선박의 법적 지위에 관해 논하고 있다. 즉, 사고 발생 후 선박 상호 간에 책임 관계에 관한 사항을 논하였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항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논문은 아니다.
둘째,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항해·통신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Yun(2021), Kim and Lee(2021)에서는 선박국적을 증명하거나 외부로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AIS와 MMSI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논문 역시 유엔해양법협 약상의 선박의 국적을 증명 또는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AIS 장비를 활용하였지만 항해안전 확보와는 관련성이 없는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류 중인 선박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서 어떤 항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이 정류 중인 선박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항해안전에 위해요소가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AIS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2. 정류 중인 선박
2.1 정류 중인 선박의 개념
2.1.1 유사 개념과의 비교
정류 중인 선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 정지하고 있는 선박들의 개념을 확정하고, 이를 상호 비교할 필요가 있다.
Kim(2002)에 따르면 해상에서 정지하고 있는 선박에는 표류, 정류, 표박, 정선중인 선박이 있다.
첫째, 표류중인 선박은 기관고장이나 조타기고장 등으로 선장의 자유의사에 따른 조종이 되지 않는 선박이다. 이러한 선박은 COLREG의 ‘Vessel not under command’1), 해상교통 안전법의 조종불능선2)의 범주에 포함되는 선박이다.
둘째, 정류 중인 선박은 선장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시 선박의 운항을 정지한 선박으로서 기관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있다는 점에서 기관이 고장난 표류중인 선박과 다르다. 영어로는 ‘Vessel lying stopped’라 하고, 실무에서는 ‘Drifting’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우리나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는 “정류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셋째, 표박중인 선박은 선장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해묘를 내려둔 상태로 기관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류 중인 선박과 같다는 의견(Lim, 2016)과 해묘로 인하여 조종성능이 제한된다는 의견(Kim, 2002)으로 나뉜다.
넷째, 정선중인 선박은 목적·사정을 불문하고 해상에서 정지하고 있는 선박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2.1.2 COLREG상 개념
COLREG 제3조 정의에 따르면 ‘항해중’이라 함은 선박이 묘박하거나, 또는 육안에 계류하거나, 또는 좌초되어 있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하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 함은 어망, 밧줄, 트로올망 또는 기타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운전부자유 선’이라 함은 어떤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규칙이 요구하는 대로 조종될 수 없고, 따라서 타선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또한 ‘조종성능이 제한된 선박’이라 함은 종사하고 있는 작업의 성질상 이 규칙이 요구하는 대로 조종될 수 없고, 따라서 타선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그리고 ‘흘수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선박’이라 함은 흘수로 인하여 가항수역의 수심과 폭에 여유가 적어서 현재 취하고 있는 침로를 이탈할 능력이 극히 제한된 동력선을 말한다. 그리고 정류 중인 선박의 지위는 COLREG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히 대수속력이 없는 항 행중인 선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IMO에서 발간하는 COLREG 용어집에서도 COLREG 제35조 B항을 고려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도 항행중이며 항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정류 중인 선박은 COLREG 제23조에 따라 항해 중인 동력선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고, AIS 역시 항해중인 동력선(Underway using engine)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선박의 상태를 나타내는 등화 및 형상물과 AIS를 그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재결한 바가 있다. 하지만 정류 중인 선박이 조종불능선의 등화 등 특수한 상황을 표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인 현실이다.3)
2.2 정류 중인 선박의 법적 지위
2.2.1 개요
정류 중인 선박의 항법상 지위는 국내외 학자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국내·외 판례(재결)까지도 일반항법 적용에 대한 의견과 선원의 상무규정 적용에 대한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사견으로 그 이유는 선박 충돌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법의 일반적 원칙에서 출발하여 고려할 사항이 많고 충돌의 직접적 혹은 근접한 원인을 찾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된다.
2.2.2 일반항법 적용에 대한 입장
일반항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정류하고 있는 선박도 항행중이므로 정류 중인 선박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반항법을 적용하여 만약 접근하는 상대선을 자신의 우현에 두고 있다면, 횡단항법이 적용되어 정류하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이 된다는 의견이다. 영국의 Cockcraft 선장은 Cockcroft and Lameijer(2007)에서 정류중인 선박은 조종 불능선, 조종제한선이 아닌 경우 전방에서 우측 정횡 후 22.5도까지 방향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는 다른 선박을 피해야 한다고 저술했다. 이는 IMO에 의해 승인된 문서인 MSC.1/Circ.320에 기반한 내용이다. 박용섭 교수는 Park(1998) 에서 “선박운용의 기술상 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일시적으로 기관을 정지하고서 그리고 선수방향으로 전진타력 없이 장시간 표류하는 경우에도 표류선박이 오른쪽 선수 방향에 상대방 선박을 보는 경우 그리고 항진하는 선박이 기관을 일시정지한 채 표류중인 다른 선박을 자선의 오른쪽 선수방향에서 본 경우에도 교차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저술했다. 김인현 교수는 Kim(2018)에서 “대수속력이 없는 정류도 항행 중이고, 이는 COLREG 제35조 B항 항행 중인 선박의 신호로서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항행 중이란 일반적인 경우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정선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역시 Cockcroft선장이 근거로 한 IMO에 승인된 문서에 기반한 내용이다. 또한 Kim(2002)에서 “국제규칙을 비롯한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류중인 선박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류중인 선박은 항행 중인 선박의 범주에 속하고, 정류중인 선박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기관사용이 가능하여 우선권을 부여할 만큼 조종성능이 열등하지 않고, 정류중인 선박은 항법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시간동안 정침하고 있고 조우상태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항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하였다.
2.2.3 선원의 상무규정 적용에 대한 입장
선원의 상무규정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일반항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선박이 정침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정류 중인 선박은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횡단항법을 적용할 수 없고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견은 동일하게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하면서도 정류 중인 선박과 상대선이 동등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과 정류 중인 선박은 조종성능이 일반 동력선보다 열등하므로 정류 중인 선박이 우선권을 가지고 일반 동력선은 정류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진다. 이 입장은 우리나라 및 일본의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석원 교수는 Lim(2016)에서 “정류선박은 항행중인 선박으로 보아서 일반항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하되, 피항에 있어서는 동등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항법상의 지위를 가진 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에서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를 ‘예외적으로’라고 표현하였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류중인 선박은 대수속력이 없는 항행중인 선박이다. 따라서 정류중인 선박에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피항 에 있어서는 동등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항법상의 지위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2.3 국·내외 사고사례와 판례(재결)
2.3.1 일반항법 적용에 대한 입장
일반항법을 적용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판례 및 재결로는 City of Camden호 사건(미국), Lucania호 사건(영국), 어선 제7대선호, 어선 3해영호 충돌사건(우리나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어선 제306대성호, 유조선 다이아몬드 데스티니 충돌사건(우리나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이 있다.
City of Camden호 사건(A.M.C. 1930)은 미국 델라웨어강에서 발생했고 예인선 Triton호는 연료유가 실린 바지선 Monessen을 예인하여 부두에 정박중인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고자 하였다. 당시 조류는 밀물 3노트였고, Triton호는 엔진을 멈추고 상류로 떠내려가면서 바지선 Monessen을 부두에 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증기선 City of Camden호는 강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양 선박이 2,000피트가 떨어진 시점에서 예인선 Triton호에 있는 사람들은 City of Camden호가 예인선의 우현에 위치하고 있었고 강을 따라 내려오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예인선은 두 선박의 상대적 위치를 관찰한 후 바지선을 부두에 붙일 의도로 엔진을 기동했다. 양 선박이 1,000피트 떨어진 시점에 있을 때, City of Camden호는 자신의 코스와 속도를 유지할 의도를 알리기 위해 휘슬을 한 번 울렸고, Triton은 두 번의 휘슬로 응답했다. 이후 City of Camden호는 예인선과 바지선이 자신의 선수를 앞지르는 것을 보고 엔진을 반대로 돌렸지만 충돌을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City of Camden호의 선수는 바지선의 선미에서 약 10피트 떨어진 측면과 충돌하여 바지선을 손상 시켰다. 원심에서는 해당사건은 횡단항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항소법원에서는 횡단항법을 적용하여 Triton호가 피항선, City of Camden호가 유지선으로 보고 Triton호의 과실로 인정한 사건이다.
Cockcroft and Lameijer(2007)에 따르면 Lucania호 사건에서 정류중이던 Lucania호가 자신의 우현에 항행중인 Broomfield 호를 두고 서로 접근하고 있었고, 이후 충돌하였다. 영국법원은 횡단항법을 적용하여 피항의무불이행을 이유로 Lucania호의 일방과실로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Lucania호가 야간에 정규항해등을 표시하였고, Broomfield호는 항행중에 표시하는 항해등을 시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한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어선 제7대선호, 어선 3해영호 충돌사건(KMST, 1996)에서 3해영호는 집어등을 밝이고 해묘를 설치한 다음 1노트의 북 북동해류에 따라 흘러가며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하다가 전속력으로 항해를 하였다. 이후 어선 제7대선호와 충돌하였다. 해당 충돌사건에서 3해영호 선장이 당시 기관이 작동되고 있었으나 클러치를 연결하지 않아 정지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중앙해심은 이 선박이 기관만 작동한 채 정지중에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항해등을 표시하고 있었고 의도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횡단선의 피항 의무가 면제되거나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재결하였다.
어선 제306대성호, 유조선 다이아몬드 데스티니 충돌사건 (Donghae-KMST, 2018)에서 총톤수 35톤에 AIS를 설치한 제306대성호는 자선 전방 약 4~5마일 앞에 있는 상대선인 다이아몬드 데스티니호를 눈으로 보았으나, 정류 중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항해하는 선박이라 충분히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는 이 선박의 선장은 부인에게 위성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잘 연결되지 않아 수차례 통화를 시도 하던 중 전방을 보니 상대선이 이미 약 10미터까지 가까워져 전속후진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울릉등대로부터 방위 031 도, 약 18.6마일 거리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부와 다이아몬드 데스티니의 우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5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 한편, 총톤수 60,379톤에 AIS를 설치한 다이아몬드 데스티니호는 목적항 도착시간 조정과 선박평형수 교체를 목적으로 충돌장소 부근 수역에서 기관을 정지한 후 정류하였다. 이때, 급한 경우 10~15분 정도면 기관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충돌 30분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이동을 살펴보면 충돌 당시의 선수방위 약 344.7도를 제외하고 약 350도를 중심으로 좌·우로 약 2도씩 유지하였으므로 선수방위 약 350도로 정침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이 선박은 대지침로 약 292.5~304.8도, 대지침로 약 292.5~304.8도, 대지속력 약 0.6~0.8노트로 이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선박은 정류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항법 상 “대수속력 없이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선박은 조종제 한선을 의미하는 흑구 2개를 수직으로 설치하고 AIS도 ‘Not under command’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충돌상황과 관련해서는 레이더로 약 6마일 거리에서 항해중인 상대선이 CPA 약 0.5마일 정도로 접근하고 있음을 았고, 상대선박이 계속해서 접근하자 충돌 2분 전부터 위험을 느끼고 장음 5회의 기적을 울렸으나 피항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충돌하였다. 본 사건에서 동해해심은 횡단항법을 적용하여 정류중인 다이아몬드 데스티니가 제306대성호를 자선의 우현 쪽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항선에 해당하고 제306대성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고 재결하였고, 정류 중인 선박은 조종불능선이 아니므로 형상물과 AIS의 오표기에 관하여 시정을 권고 하였다. 그리고 제306대성호 또한 경계소홀과 피항협력동작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재결하였다.
2.3.2 선원의 상무규정 적용에 대한 입장
선원의 상무규정 적용설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재결로는 세일링요트 나바다호, 낚시어선 수성호 충돌사건, 낚시어선 희망호, 모터보트 몽돌바당 충돌사건이 있다.
세일링요트 나바다호, 낚시어선 수성호 충돌사건(Busan- KMST, 2021; KMST, 2021)에서 나바다호 선장은 엔진을 가동하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상태로 돛으로 바람을 받으며 항해하였는데, 거가대교 중 거제도와 저도를 연결한 교각 아래를 통과한 후 약 2.5노트 내지 3노트의 속력으로 남쪽에 위치한 옥포 방향으로 나바다호를 진행시키다가 본선 좌현 선수 방향으로 약 600미터 거리에서 정류상태로 낚시를 하던 수성호를 발견하였다. 나바다호 선장은 수성호와 점점 가까워지자 수차례 우현쪽으로 2도 내지 3도 변침하였으나, 나바다호 좌현 선미부로 수성호 좌현 선미부를 선수미선 교각 약 17도로 추돌하였다. 한편, 수성호 선장은 낚시객들이 낚시를 하는 동안 엔진을 계속 가동하되 클러치를 중립에 두어, 수성호가 대수속력 없이 조류에 따라 흘러가게 한 상태였다. 부산해심과 중앙해심은 나바다호를 대수속력 있는 항행 중인 동력선, 수성호를 대수속력이 없는 항행중인 동력선(정류선박)으로 보고,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중인 선박’ 이 정류 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낚시어선 희망호, 모터보트 몽돌바당 충돌사건(KMST, 2022)에서 희망호는 자선 정선수 약 0.6마일 전방에서 정류 상태로 물돛을 걷어 올리기 시작하고 있던 몽돌바당을 육안 및 레이더로 식별하지 못하였고, 침로 130도, 속력 약7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후 자선의 진로 전방을 횡단하는 제3의 선박을 발견하고 이 선박이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 클러치를 중립에 두어 속력을 낮추었다가 제3의 선박이 자선의 진로 전방을 완전히 지나간 후 다시 속력을 올렸다. 그리고 침로 130도 속력 약 4노트로 항해하던 중, 희망 호 정 선수부와 몽돌바당의 좌현 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 미선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 충돌 직전 몽돌바당 선장은 물돛을 올리는 데 열중하느라 자선으로부터 09시 방향, 약 0.6마일 거리에서 자선을 향해 접근하고 있던 희망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후 물돛을 선수 갑판에 끌어 올린 후 몸을 뒤로 돌리면서 자선으로부터 09시 방향, 약10미터 거리에서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급히 조종석으로 뛰어 들어갔으나 충돌하였다. 이 사건에서 중앙해심은 희망호는 대수속력이 있는 항행중인 동력선, 몽돌바당은 대수속력이 없는 항행중인 동력선에 해당하고,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하여 희망호가 몽돌바당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고 재결하였다.
2.4 소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류 중인 선박의 법적 지위는 COLREG 상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COLREG 상에서 항행중인 동력선보다 조종성능이 열등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운전부자유선, 조종성능제한선, 흘수제약선도 아니다. 그러므로 정류 중인 선박은 대수속력이 없는 항해중인 동력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정류 중인 선박에게 일반 동력선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일반항법 적용에 대한 입장과 정류 중인 선박은 정침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동력선이 정류 중인 선박을 피해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규정 적용에 대한 입장이 학자들의 의견과 판례 모두 서로 대립하고 있다.
정류 중인 선박의 법적 지위 불명확성뿐만 아니라 외관상 항해사가 정류 중인 선박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정류중인 선박으로 인한 해상에서의 사고 가능성이 상존해있다.
단순히 정류중인 선박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의 가능성을 경감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나 선박충돌 발생 후 민사책임 측면에서 사고의 책임은 직접적 혹은 근접한 원인을 찾는 것이므로 지위를 명확히 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책적 측면에서 사고의 근본적 원인제공자의 책임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고의 책임을 가리는 법적 지위를 명확성을 가리기 전에 정류 중인 선박을 식별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AIS의 개요와 특성
3.1 개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로써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고, VTS(Vessel Traffic Service)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그리고 모든 여객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IMO, 2015). AIS에 대한 국제적 기술표준은 ITU-R M.1371-5(ITU, 2014)을 만족하여야 하며, IEC61993-2(IEC, 2018)의 AIS 시험표준을 만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IS는 정보송신을 위해서 VHF주파수(161.975Mhz, 162.025Mhz)를 이용하여, SOTDMA 채널 접속 알고리즘을 통하여 슬롯을 할당 받는다. AIS의 핵심기술로서는 AIS 채널접속 알고리즘, GPS 시간동기화 기법, VHF 송수신 설계 등이 있다(Lee and Lee, 2006).
3.2 AIS 전송 정보
AIS정보는 정적정보, 동적정보, 항해정보로 구분된다(IMO, 2015; ITU, 2014). 각 정보별 세부사항은 Table 1과 같다.
이 중에서 동적정보(Dynamic Information)인 항해상태(Navigation status)는 선박의 현재상태를 알려주고, 항해사가 수동으로 설정해야 하는 항목이다. IMO Res.A.1106(29)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해상태의 예는 “Underway by engines, At anchor, Not under command(NUC), Restricted in ability to manoeuvre(RIATM), Moored, Constrained by draught, Aground, Engaged in fishing, Underway by sail로 9가지가 있다. 한편, 이 정보는 COLREG의 등화 및 형상물을 변경하는 동시에 설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해상에서 사용중인 AIS장비의 항해상태 목록은 Table 2와 같다.
항해상태 목록은 현재 사용하는 항해상태 외에도 향후 사용될 것을 대비해 09번에 고속선, 10번에 위그선을 지정해두었고, 13번은 향후 이용을 위해서 남겨두었다.
한편, AIS 정보 전송 주기는 동적정보와 동적정보 이외의 정보로 구분되고, 동적정보 이외의 정보는 매 6분마다, 동적 정보는 Table 3과 같이 선박의 동적 상태에 따라 다른 주기로 전송된다. 그리고 동적정보는 1개, 정적정보는 2개의 슬롯을 차지한다.
4. 정류선박의 AIS 활용방안
4.1 개요
실무에서는 정류 중인 선박이 항행 중인 동력선과 동일한 등화를 표시하고, AIS 항해상태도 ‘Underway using engine’으로 설정한다. 이는 정류 중인 선박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른 선박의 항해사가 외관상 정류 중인 선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해안전에 저해요소가 된다. 따라서 다른 선박이 정류 중인 선박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4.2 AIS 적용
현재 AIS의 항해상태(Navition Status Option)는 Table 2와 같이 00번에서 15번까지 할당되어 있다. 이중 13번은 Reserved for future use로 향후 사용을 위해서 남겨둔 옵션이다. 따라서 해당 옵션을 정류 중인 선박(Vessel lying stopped)으로 변경하여 정류 중인 선박의 상태를 타선박에게 외적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 선박국적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AIS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Yun, 2021). 하지만 Table 1과 같이 기존에는 AIS가 표시하는 정보에서 국적을 표시하는 정보의 항목이 없기 때문에 국적표시를 위해 이를 추가한다면 slot 당 256bit라는 AIS Data Packet의 용량을 초과할 것이므로 AIS Data Packet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기술적 제약사항이 발생한다(Fig. 1).
이에 반해, 기존에 존재하는 항목인 항해상태에 특정 번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AIS Data Packet 구조의 변경없이 간단한 업데이트만으로도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AIS는 매년 시행되는 선박검사에서 항해장비 및 설비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육상정비업체에 의해 매년 점검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제안이 시행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연차검사시 AIS 장비를 업데이트하도록 하면 AIS 체계의 변경과 선박에서의 혼란 없이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5. 결 론
5.1 결론
정류 중인 선박은 대수속력이 없는 항행중인 동력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지위는 COLREG 상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 해심은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학설과 판례 모두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과 외관상 다른 선박에서 정류 중인 선박을 식별할 수 없는 점으로 인하여 항해안전에 위해요소가 된다.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의 가능성을 경감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나 선박충돌에 대한 책임은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으므로 정류 중인 선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을 극복하여 해상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선박에서 정류 중인 선박을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한편, AIS는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의 정보와 더불어 항해상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이다. 항해상태는 IMO(2015)에 따라 00번 ~ 15번의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 13번은 Reseved for future use로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남겨둔 선박상태 옵션이다.
따라서 정류 중인 선박을 외부에서 식별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3번을 정류 중인 선박(Vessel lying stopped)으로 변경하여 활용해야 한다.
5.2 연구의 한계
AIS는 SOLAS 제5장 항해안전 제19.2.4규칙에 따라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과 국제항 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그리고 크기에 관계없는 여객선“에 적용되는 장비이다.
2024년 2월 17일 9,000톤급 LNG선박(정류중인 선박)과 5,000톤급 화객선박(항행중인 선박)이 전남 완도군 여서도 해상에서 충돌한 사례를 비롯하여 앞서 언급한 어선 제306 대성호, 유조선 다이아몬드 데스티니 충돌사건과 같이 AIS가 적용된 선박의 경우에는 AIS를 활용하여 항해안전을 제 고할 수 있으나 세일링 요트 나바다호, 낚시어선 수정호 충돌사건과 낚시어선 희망호, 모터보트 몽돌바당 충돌사건과 같이 소형 선박에는 AIS가 적용되지 않아 본 연구의 항해안 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정류 중인 선박 상태를 외부로 표시하는 등화 및 형상물, AIS 상태 옵션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COLREG 상 정류 중인 선박의 정의와 법적 지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류 중인 선박의 정의와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면 등화 및 형상물, AIS 상태도 당연히 부여될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의 의견과 판례(재결)가 대립되고, 민사책임에서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류 중인 선박의 COLREG 상 법적 지위가 부여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