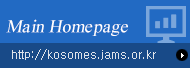1. 서 론
우리나라의 국내 항간 해상물동량을 담당하고 있는 내항 상선은 최근 해기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내항해운 산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상선대는 2022년에 비해 2027년까지 증가가 예상되 는 반면 해기사는 부족한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해기사 공급 국가의 해기사 인력 공급 불안정 요인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부족,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한 대학들의 폐쇄, 필리핀 상선대 해기사들이 자국의 크루즈 여객선으로 이동 및 중국 해기사의 자국 선박 우선 배치 정책 등으로 해기사의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BIMCO, 2021).
우리나라의 내항상선은 최근 10여 년간 초급 해기사인 5급 및 6급 해기사 공급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고, 이로 인하여 미래의 해기사의 연령도 고령화로 점점 더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항상선 해기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60대 이상의 비중이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57.2%를 차지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고령 해기사들의 은퇴로 가까운 시기에 내항상선 해기사의 공급망 붕괴가 우려될 것으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에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해기사 공급 자원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구직 선호도의 변화 외에도 사병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더 이상 초급 해기사의 유인책으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근로조건 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 변화와 육상 직종과의 임금 격차 축소로 인해 해기사 직종의 매력도가 크게 감소하여 젊은 인재들의 해기사 직종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 기간산업인 내항상선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해운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한 해기사의 확보가 시급하다.
자율운항선박 및 친환경 선박의 출현 등으로 해기사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당장 전통적인 선박을 대체하여 해기사의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해기사의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므로 젊고 유능한 해기사가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유입될 수 있는 양질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유급휴가 일수의 확대, 육상과의 통신시설의 최신화, 근로소득 면세정책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기사 유입정책과 더불어 외국인 해기사의 국내 유입도 고려하여 내항선의 해기사 공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내항상선의 해기사 확보의 한계를 고려하여, 해기사 유입책과 외국인 해기사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하고자 한다. 국내 해기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선제적으로 능력있는 외국인 해기사를 선점하기 위하여 해기사 도입 및 국내 선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한국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선원 수급 전망
2.1 국제적인 전망
Drewry Manning Annual Review and Forecast 2022/2023에 따르면, 세계 상선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해기사의 부족 문제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세계 상선대는 62,480척으로 집계되었으며, 2027년까지 약 6.3% 증가하여 66,400척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상선대 규모의 증가는 선박 운항을 위한 필수인력인 해기사 수요 증가로 직결된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기사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22년 기준 해기사 부족 인원은 약 35,000명으로 파악되었으며, 2027년에는 그 부족 규모가 5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세계 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Drewry, 2022/2023).
주요한 요인으로는 전 세계 주요 해기사 송출국의 정치· 경제적 불안정성은 해기사 공급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국가의 해기사 공급 능력을 크게 저하시켜 EU 및 글로벌 해기사 부족을 악화시켰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 국제 제재와 해기사 양성 시스템 붕괴를 겪으며 고용 불안정을 초래했다. 필리핀은 해기사의 크루즈 선박 이동과 EU 및 일본의 해기사 선점으로 인해 상선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자국 선박 우선 정책으로 해외 송출을 제한했으나 최근 외국 해기사 고용을 확대하는 추세다(BIMCO, 2021).
BIMCO Seafarer Workforce Report(2021)에 따르면, 세계 주요 선원 송출국 상위 10개국은 전 세계 해기사 송출 인원의 약 45.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필리핀,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가 해기사 송출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주요 선원 송출국 중 필리핀은 81,090명의 해기사를 송출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9.5%)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러시아(71,652명, 8.4%), 중국(69,364명, 8.1%), 인도 (58,645명, 6.8%), 인도네시아(51,237명, 6.0%)가 뒤따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47,059명(5.5%)으로 상위 6위에 랭크되었으 며, 미얀마는 13,923명(1.6%)을 송출하며 10위에 자리하고 있다. 상위 10개국에서 송출된 해기사는 총 392,97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송출 인원의 45.8%에 해당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세계 상선대의 성장과 해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송출국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다양한 불안정 요인들이 이를 저해하고 있어, 글로벌 해운 산업은 해기사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BIMCO, 2021).
결론적으로 세계 상선대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기사 부족 문제는 해운 산업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의 군사적 불안, 필리핀 해기사의 고용 패턴 변화, 중국의 정책적 변화와 같은 요인들이 주요 해기사 송출국의 인력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 해운업계에 심각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송출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해기사 양성 시스템을 강화하는 국제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2.2 주요 국가의 내항해운 현황 및 지원제도
1) 미국
미국은 국방과 안보상의 필요성으로 인해 다양하고 독자적인 해운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카보타지 정책은 강력한 내항해운 보호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내항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며, 미국인 선원이 승선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카보타지 적용 선박과 비적용 선박 간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으며, 외국인 선원이 내항선박에 승선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선원의 임금 수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내항 해운에 대한 직접적인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지 않지만, 엄격한 카보타지 제도를 통해 외국인 승선을 제한함으로써 미국 내항 선원의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선원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KMOA and others, 2020).
2) 일본
일본의 외항 선원 수는 1974년 약 5만 7,000명에서 2019년 2,600명으로 급감하였으며, 선원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 또한 심화되고 있다. 내항 상선의 주요 선원 공급원은 수산·해양계 고등학교(36.4%)이며, 그 뒤를 이어 해상기술단기대학교 졸업생(34.4%)이 내항 선원의 중요한 인력 풀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민간 양성 교육기관에서 배출한 신6급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내항 선원의 경우 육상 직업군에 비해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으며, 노동시간이 평균 1.1배 더 길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은 육상 직업군보다 약 1.43배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부족한 내항선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일본선원의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선원 육성 및 확보를 위한 예산조치를 도입하고, 비상시 수송체제를 확립함과 함께 법령의 준수를 완화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 선원 지원제도를 통하여 내항선원의 확보 육성을 위해서, 일본 정부는 ‘세금지원제도’, ‘공동형 선원확보육성보조금’, ‘신규선원자격취즉 촉진 조성금’, ‘선원 계획고용 촉진조성금’, ‘선박공유제도 하에서의 금리 경감’,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선원이 내항선 승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KMOA, 2022).
2.3 내항상선의 현황 및 시사점
1) 내항상선 선원 취업 현황
2023년 말 기준, 내항상선에서 승선하는 선원은 총 7,433 명이며, 이 중 해기사는 5,889명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한다. 특히,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이 4,720명(63.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해기사의 경우에도 500톤 미만 선박 승선 비중이 68.7%(4,047명)로 확인된다. 내항상선의 선령별 현황을 보면,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선이 54.8%(1,211척)로 나타나 선박의 노후화와 소규모 선박 중심의 구조가 선원의 승선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MOF ㆍKOSWEC, 2023).
한편, 최근 10년간(2014년-2023년) 국적 선원의 취업은 연 평균 2.13% 감소하였다. 해기사의 감소율은 1.36%로 비교적 낮은 반면, 부원의 감소율은 3.93%로 더 큰 감소폭을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에서 고용된 외국인 부원은 같은 기간 동안 631명에서 1,095명으로 74%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부원의 41%에 해당한다. 외국인 부원 고용 선박의 비중은 16%에서 20%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내 항상선의 80%는 국적 선원 고용에 의존하고 있어 국적 선원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MOFㆍKOSWEC, 2023).
2) 내항상선 해기사 현황 및 전망
최근 10년간(2014년-2023년) 내항상선 해기사의 면허 등급별 및 연령별 현황을 분석하면, 초급 해기사(5급·6급)의 지속적인 감소가 두드러진다. 항해사의 경우 5급은 579명에서 562명으로, 6급은 375명에서 32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기관사의 경우 5급은 406명에서 303명, 6급은 393명에서 269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신규 해기사 인력의 공급 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시사한다(MOFㆍKOSWEC, 2023).
2023년 기준, 내항상선 해기사(5,945명) 중 60대 이상이 57.2%(3,400명)로 나타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항해사의 경우 60대 이상 비중은 55.6%, 기관사는 59.2%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4년에 비해 각각 41.5%에서 55.6%, 49.4%에서 59.2%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선종별로는 예인선(86.9%)과 유조선(73.9%)에서 60대 이상 해기사의 비중이 특히 높아, 젊은 해기사가 기피하는 업무 강도가 높은 선종에서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MOFㆍKOSWEC, 2023).
종합적으로, 내항상선의 해기사는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추세이며, 초급 해기사의 감소와 함께 60대 이상의 고령 해기사가 은퇴할 경우 수급 부족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및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젊은 인력의 승선 유도 정책, 노후 선박 교체 등이 필요하다.
내항상선 해기사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기준 내항상선의 해기사 부족 인원은 58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32년에는 3,93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항해사와 기관사 모두에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항해사의 경우 2022년 393명 부족에서 2032년 2,292명 부족으로, 기관사의 경우 2022년 196명 부족에서 2032년 1,644명 부족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5급 및 6급 해기사의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2022년 기준 5급 항해사는 401명, 6급 항해사는 896명이 부족했으며, 이 숫자는 각각 2032년까지 605명과 1,19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사의 경우 5급은 744명 부족에서 852명 부족으로, 6급은 502명 부족에서 581명 부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내항상선 해기사의 공급 부족 문제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KSA, 2022).
내항상선 해기사 배출은 주로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에서 이루어지며, 이들 학교에서는 4급 해기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완도수고와 포항해고 등 수산계 고등학교에서는 4급 및 5급 해기사를 양성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경우에, 2024년 기준 5급 해기사 양성 현황을 보면, 항해 및 기관 분야 각각 30명을 배출하였으며, 수산계 5급 해기사는 항해 및 기관 각각 20명이 배출되었다. 6급 해기사의 경우, 항해 및 기관 분야 각각 10명이 양성되었다.(MOFㆍ KOSWEC, 2023).
3) 내항상선 해기사 부족 원인(KSA, 2022)
내항상선 해기사 양성기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해기사 부족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항상선 해기사의 공급 부족 문제는 구조적, 인구학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해기사 인력은 연령 및 등급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50세 이하 해기사 인력은 모든 연령대와 등급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이는 내항상선의 인력 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항 상선의 6급 해기사의 경우, 98% 이상이 정규 해기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출신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는 상위 등급 해기사의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내항상선 전체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의 학령인구 감소 현상은 젊은 해기사 공급 부족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감은 내항상선을 비롯한 전체 해운 산업에서 신규 인력의 유입을 어렵게 만들며, 이는 인력 공급 기반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규 해기사의 유입이 감소하는 이유는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해운업계의 인력 공급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둘째, 내항상선의 높은 노동 강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육상직이나 외항상선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잃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내항상선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항상선으로의 인력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외항상선은 내항상선보다 더 나은 임금과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해기사가 내항상선을 떠나 외항상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내항상선 해기사 공급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구조적 개선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4) 시사점
내항상선 해기사의 공급 부족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대응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규 교육기관 및 대체 경로를 통한 해기사 양성 확대, 내항상선의 근로 환경 개선, 임금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외항상선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항상선 고용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대책은 내항해운의 영세성, 젊은 세대의 선박생활 기피, 외항상선 대비 저임금 구조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당장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해기사를 도입하 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외국인 선원의 내항상선 고용현황 및 선박직원법 개선방안
3.1 외국인 선원의 취업현황
지난 10년간 외국인 선원의 고용은 2014년 22,695명에서 2023년 30,436명으로 34.1% 증가하였다. 2023년 기준 전체 선원 61,023명 중 외국인이 약 49.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내 항상선의 외국인 부원 고용은 2014년 655명에서 2023년 1,095명으로 67.2% 증가했으며, 주요 국적은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이다. 이러한 외국인 선원의 고용 증가는 내항상선 및 외항상선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MOFㆍKOSWEC, 2023).
3.2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
외국인 선원의 고용 제도는 「근로기준법」및 「선원 법」을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다. 외항상선의 외국인 선원 고용은 「선원법」및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내항상선의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순항크루 즈선 및 20톤이상 어선도 「선원법」및 「외국인선원 고용 관리지침」에 의하여 관리된다. 내항의 20톤 미만의 어선은 「근로기준법」의 고용허가제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내항의 외국인 선원의 도입 절차는 노사 합의 후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부원에게는 선원취업(E-10) 비자가 부여되며, 이는 부원에 한정되고 있다.
3.3 내항상선 외국인 해기사 고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인 해기사는 현재 국제항해 선박에서만 승무가 허용되고 있으며, 내항상선에서는 법적으로 승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항상선 해기사는 고령화와 신규 인력의 감소로 인해 심각한 수급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5급 및 6급 해기사의 인력 감소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젊은 해기사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60대 이상의 고령 해기사들이 은퇴하게 되면 내항상선의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내항상선의 운영 지속 가능성이 위협 받을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선원 고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항상선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제항해 선박에서 외국인 해기사가 승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선박직원법」제10조의21) 규정을 내항상선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
개정된 규정은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되, 연안수역 또는 제한수역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어선은 예외로 두어야 한다. Table 1과 같이 법 개정을 통해 내항상 선의 해기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제한으로 인한 인력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위의 방법으로 해기사를 수급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으로 비자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는 법무부 규정은 E-10비자로 부원만을 송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기사를 송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외국인 해기사 내항선 고용을 비자제도 활용방안
4.1 비자제도 검토2)
1) E-5 비자
E-5 비자는 법률, 회계, 이료 등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선박운항의 필수 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 E-5비자는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 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때 필수 전문요원은 ‘금강산 관광선 및 한국선적 정기여객선 등의 선장, 기관사, 항법사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정의는 해당 비자의 목적과 범위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한국선적 정기여객선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한중, 한일 여객선 및 내항상선 등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내항상선의 해기사를 필수 전문요원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 법적 해석의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명확한 개정이 요구된다.
개정 방향으로는, 현행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필수 전문요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규정에 따라 필수 전문요원의 범위를 “선원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선장 및 동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직원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운항사, 어로장, 사무장 및 의사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내항상선 해기사까지 포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자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E-5 비자의 세부 기준은 관련 법령과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 및 보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전문인력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E-7 비자
E-7 비자는 특정분야에서 전문,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 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해당하며, 국민 고용 보호를 목적으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국민 대체가 어려운 전문 인력으로 국부 창출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활용된다.
선박직원의 경우 전문비자 발급 직종인 전문인력에 해당하고, 해기사 관련으로는 운송서비스 종사자(431)3)가 있다. 운송서비스 종사자는 「선원법」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해기사를 포함하므로, 해기사 송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 공인 자격증 소지자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장 등은 전문직업으로 간주되어 E-5 비자로 송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기여객선 및 관광선 승무원과 같은 서비스 직군은 특정활동(E-7) 비자로 송입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기사는 전문직업으로 분류되므로, 법적 기준에 따라 E-5 비자를 통해 송입하는 것이 적합하다.
3) E-10 비자
내항선 국적선박에 승선하는 부원은 E-9 비자(단순노무)에서 분리되어 E-10 비자로 송입이 가능하고, 현재도 E-10비자로 송입하고 있다. 해기사는 E-5 비자(전문비자)로 송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10 비자는 목적상 부원을 단순노무를 분류하였고, 해기사를 E-10 비자로 송입하는 검토 결과 어렵다고 판단된다.
4.2 비자제도 연계한 해기사 양성방안
1) 외국인 경력직 부원을 해기사로 양성
E-10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내항선에서 선원(부원)으로 승선하며 한국어에 능통해진 경우, 국내 선원교육기관에서 해기사 양성교육을 받아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고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경로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해당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한 후 D-4(일반 연수) 비자로 재입국하여 해기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방안 이다. 둘째, E-10 비자의 유효 기간 내에 D-4 비자로 전환하여 국내에서 교육을 이어가는 방안이다. 해기사 면허를 취득 후 E-5 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은 외국인 선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항선에서 해기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체류와 전문직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국어 능통자를 대상으로 해기사 양성
D-2 비자(유학비자) 등으로 한국에 유학 와서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선원교육기관에서 해기사 양성교육을 받아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고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이 학업을 마친 후 두 가지 비자 전환 경로를 활용할 수 있다. 첫째, D-4(일반연수) 비자로 전환하여 해기사 양성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둘째, D-10(구직) 비자로 전환하여 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 취득 후 직접 취업 활동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해기사 면허를 취득 후 E-5 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 유학생의 전문직 전환을 지원하며, 내항선 및 국제선에서 활동할 해기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전문적 성장과 한국 해운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 된다.
3) 인구소멸 지역의 체류형 비자제도 활용 외국인 해기사 양성 및 고용 방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처럼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을 대상으로 내항상선 선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화형 비자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4)
인구소멸형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형 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해기사들이 내항상선에 승선하면서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비자 제도는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내항상선 선원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해운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우수 외국인을 지역으로 유치 및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공모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의 필요에 맞는 외국인 유치 및 정착 방안을 모색한다.
4) 미래의 외국인 해기사 활용방안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교육을 통한 취업 및 거주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수부와 법무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자국민화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및 고령화 해소와 산업 필수인력인 해기사 확보를 위해 체류자격에 대한 개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Fig. 1과 같이 미래의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5. 결 론
최근 10년간(2014~2023년), 내항상선의 초급 해기사(5급·6 급)의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항해사는 579명에서 562명, 기관사는 406명에서 303명으로 급감하였다. 이와 함께 해기사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내항상선 해기사의 57.2%가 60대 이상이며, 항해사의 경우 41.5%에서 55.6%로, 기관사의 경우 49.4%에서 59.2%로 비중이 확대되었다. 특히 선장과 기관장의 60대 이상 비중은 각각 75.1%, 83.9%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내항상선의 저임금 구조와 열악한 근로 조건에 기인한다. 임금의 열악함과 높은 노동 강도는 젊은 해기사의 승선 기피와 외항상선으로의 인력 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정규 해기사 교육기관 출신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초급 해기사의 공급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이로인해 상위 등급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내항상선 업계는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큰데, 외국인 해기사 도입은 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박직원법」개정 등 법적 정비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을 합법화하고, 체계적인 양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해기사의 ‘교육∼취업∼거주’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체류자격을 개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 해기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장기적으로 내국인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면서 산업 필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외국인의 자국민화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소에 기여하며, 산업 필수인력인 해기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의 양성과 내국인화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물론 외국인 해기사 고용전에 내항상선 업계의 근로조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과 체계적 양성, 근로환경 개선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