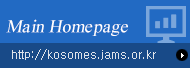1. 서 론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해양 사고 중 하나인 X-PRESS PEARL호 사고는 컨테이너 운송 분야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21년에 발생한 이 사고는 2,700TEU 규모의 컨테이너 피더선에서 침몰이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사고 선박에는 총 1,486개의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었으며, 그중 81개의 컨테이너에는 위험화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화재 발생 2주 만에 전손되었으며, 이 사고의 결과로 대량의 플라스틱 펠릿과 유독성 화학물질이 해양으로 유출, 역사상 최악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로 인해 해양 생물의 서식 환경이 파괴되고, 독성 노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발생했으며, 스리랑카 연안의 해양 및 연안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었다(Zhang et al., 2023).
선박에 탑재되어 있던 연료유로 인해 유류오염과 같은 직접적인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선박에 적재된 위험화물 컨테이너에서 유출된 독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1년 개최된 해양환경전문가그룹 (Joint 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이하 GESAMP)은 해양쓰레기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로 운항 중 컨테이너 유실 사고를 지적했다 (GESAMP, 2021). 이와 더불어 Fig. 1에 따르면 세계선사협의회(World Shipping Council, 이하 WSC)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발생한 컨테이너 유실 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약 1,566개의 컨테이너가 해상에서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 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이하 SOLAS) 등 다양한 협약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컨테이너 유실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2023년 12월에 발생한 MAERSK사의 MAYVIEW MAERSK호 컨테이너 유실 사고(북해에서 46개의 컨테이너 유실)와 같이, 최근에도 컨테이너 유실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Shipping Telegraph, 2023).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컨테이너 유실 사고를 막기 위해 적용 중인 규정과 관련 규정 논의 동향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컨테이너 유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유실 컨테이너 관련 적용 중인 국제규정
2.1 컨테이너 유실로 인한 영향
Fig. 2는 2024년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요트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항해 중이던 요트 TIPSY호가 부유 중이던 컨테이너와 충돌하여 Eastern Cape Coastline 근처에서 선체가 손상되고 침몰한 사례를 보여준다. 당시 요트는 남아프리카 당국으로부터 해당 해역에 부유 중인 유실 컨테이너의 존재에 대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해 중 유실 컨테이너와 충돌한 후 침몰하였으며, 승선자는 남아프리카 국립해양구조대(NSRI, National Sea Rescue Institute)에 의해 구조되었다.
TIPSY호 사례는 유실 컨테이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선박, 특히 요트와 같은 소형 선박의 운항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해저에 가라앉은 컨테이너는 수심이 얕은 연안을 항해하는 소형 선박과 충돌하여 선체 손상 및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2019년 북해를 운항하던 MSC ZOE호는 네덜란드 해역 근처에서 약 270개(약 3,257톤)의 컨테이너를 유실하였다. 유실된 컨테이너의 대부분은 포장재 등 소모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중 2개의 컨테이너는 유해물질(IMDG)을 포함하고 있었다. 독성 물질이 포함된 컨테이너로 인해 대규모 연안 청소 및 회수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전체 컨테이너의 약 13%와 화물 내용물의 25%는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컨테이너 유실 사고는 운항 안전 측면과 해양 환경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고자 2.3에서 나열한 규정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
2.2 컨테이너 유실 사고 증가의 원인
컨테이너 유실 사고를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으로는 ① 선박의 불규칙 횡동요, ② 컨테이너 고박·적재 불량, ③ 황천 등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Park et al., 2022).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상에서의 컨테이너 유실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선박 불규칙 횡동요: 선박의 불규칙 횡동요(Parametric Rolling)는 선박 횡동요 고유 주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조우 주기의 파도(종동요 주기)를 선박이 만나게 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때 선수/선미 선형의 변화가 커지면서 선박 복원성이 급격히 변동하여 선박 전복 및 컨테이너 유실을 초래할 수 있다.
-
② 화물 고박·적재 문제: 컨테이너 적재·고박 과정에서 IMO 지침이나 회사 규정에 따른 적재·고박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화물 고박의 관점에서, 실무적으로 Loadcom 등의 복원성 계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복원성 기준을 1차적으로 판단하지만, 소프트웨어 계산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할지 여부는 선장, 나아가 선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특히, 지침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로 출항하는 것은 컨테이너 유실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노후화된 고박 장비로 인해 정확한 고박 하중을 측정할 수 없거나, 인적 과실 등의 문제로 인해 적재된 화물이 고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컨테이너 유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MSC ZOE호, YM Efficiency호, 그리고 Ever Smart호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는 모두 고박 장치의 결함이 컨테이너 유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
③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최근 건조되는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로 인해 해치커버의 높이가 기존 선박보다 높아졌고, 상갑판에 적재되는 컨테이너의 수가 증가하면서 컨테이너 적재 높이 역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적재 높이의 증가는 선박의 조종 성능 및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풍압력을 증가시키며, 이는 컨테이너선의 전복과 이에 따른 컨테이너 유실을 초래할 수 있다.
2.3 유실 컨테이너 관련 국제 규정
Table 1은 Hwang(2022)이 제시한 해상에서의 국제 컨테이너 운송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들을 참고하여 발췌 및 정리·분류한 내용이다.
2.3.1 난파물제거협약
난파물제거협약은 1967년의 Torrey Canyon호의 원유유출 사고 등과 같은 난파물로 인한 해양오염·안전 등에 미치는 것을 계기로 긴 논의 끝에 2007년에 채택되어 2015년 발효되었다.
동 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난파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연안국에게 이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보장하는 통일된 국제규칙 및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Park and Lim, 2015).
동 협약에선 난파물에 대해 Table 2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유실된 컨테이너는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멸실되고, 해양에서 좌초, 침몰 또는 표류하는 모든 물체”에 해당 하므로 난파물로 간주된다.
동 협약의 적용에 따라, 유실 컨테이너 사고를 발생시킨 협약체약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으로 인해 유실 컨테이너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체약국에게 난파물에 대해 보고해야할 의무를 가지며, 주변 선박 및 관련 국가에게 난파물의 위치(Locating)와 표시(Marking)에 대해 경고해야 하며, 등록선주는 난파물제거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동 협약에 따라 피해를 유발한 선주가 유실 컨테이너가 난파물로 간주됨에 따라, 난파물의 보고(Reporting)·위치탐지(Detection)·추적(Tracking)·복구(Recovery)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2 CSS Code
화물 적재 및 고박 안전실무규칙(Code of Safe Practice for Cargo Stowage and Securing, CSS Code)는 화물 단위체 또는 특수화물 등을 선상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 화물에 가해지는 외력 등을 고려한 적재 및 고박 관련 안전 실무규칙을 수록한 코드이다(MOF, 2020).
후술할 컨테이너 유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고박 문제에 대해 해당 코드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예방(Prevention) 단계에서의 조치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2.3.3 CTU Code
화물운송기구 수납 실무지침(Code of Practice Packing of Cargo Transport Units, CTU Code)는 컨테이너, 스왑 바디 등 화물운송기구에 화물을 안전하게 수납하기 위하여 고정 및 고박 등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수록한 코드이다(MOF, 2020).
CSS Code가 컨테이너가 선박에 실릴 때의 컨테이너 자체에 대한 고박과 관련되어 지침을 제공하는 반면, CTU Code 는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의 배치·적재·고박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박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 코드인 만큼 예방(Prevention) 단계에서의 조치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2.3.4 IMDG Code
국제해상위험물규칙(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IMDG Code)은 포장 형태로 운송되는 위험물을 제1급부터 제9급(기타유해성 물질)까지 분류한 후, 각각의 표시 및 표찰, 포장 방법 및 포장 용기 기준, 선적 서류, 컨테이너에 의한 위험물 운송 및 위험물의 화재 비상조치 등을 규정한다(Hwang, 2022).
CTU Code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위험물 운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에 대해 취급방법·대응절차 등의 지침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중, EmS Guide 상에서 위험화물 유출 시의 보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험물을 적재한 컨테이너가 해상으로 유실되었을 때 사고 대응 지침을 제공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컨테이너 내·외 부의 적재에 관해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컨테이너 대응과 관련된 모든 단계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5 CSC Code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CSC Code)는 컨테이너의 안전한 운송 및 취급 측면에서 인명 안전성 유지와 컨테이너의 국제운송 촉진을 위해 채택한 컨테이너의 제작·검사 및 보수점검에 관한 국제협약이다(Hwang, 2022).
다수의 컨테이너 유실 사고 분석에서 컨테이너 붕괴 하중 등의 원인으로 컨테이너 자체의 변형을 컨테이너 유실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해당 Code 또한 컨테이너 유실에 대한 대응 단계에서 예방(Prevention)과 관련된 조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2.4 소결
상기의 내용과 같이 여러 사고 등을 계기로 하여 컨테이너 내·외부의 적재·포장·고박 등에서의 컨테이너 유실 대응에 대해 예방 관점에서의 대응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실된 컨테이너에 대해서 보고·탐지·추적·제거 등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컨테이너 유실에 대한 대응 단계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대형 컨테이너 사고가 잇따라 이어짐에 따라 Table 3과 같이 컨테이너 해상 운송 안전에 관한 국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3. 유실 컨테이너 관련 국제 논의 동향 분석
3.1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는 포장 화물 및 비포장 화물의 안전한 적재, 격리, 취급 및 운송에 대한 논의를 담당하는 IMO의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이하 CCC)의 전신인 위험물, 고체화물, 컨테이너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Dangerous Goods, Solid Cargoes and Containers, 이하 DSC)에서 시작되 었다.
2007년 영국 선적 대형 컨테이너선인 MSC NAPOLI호 사고는 컨테이너선의 건조 기준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적재에 따른 총중량 기준을 재검토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MSC NAPOLI호 사고 이후 강화된 건조 기준에도 불구하고, 2013년 바하마 선적의 대형 컨테이너선인 MOL COMFORT호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 규제 체계 내에서 컨테이너선에 적재되는 컨테이너의 총중량 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DSC 15에서는 해운업계가 제출한 공동조사 프로젝트(Lashing@Sea)의 결과를 검토하고, 안전운 항의 관점에서 컨테이너의 실제 중량을 운송인에게 보고하며 이를 선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을 인지하 였다.
2012년에 개최된 DSC 17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의 회원국이 모여 컨테이너 유실 예방 조치로써 당시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화주가 선주에게 보고하는 규정은 존재했지만,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실제 중량과 선적 서류 상의 총중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Korea Maritime Center, 2013).
운송인은 화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에 의존하여 선박 운항의 핵심인 감항성 계산, 선체 구조 강도 계획, 운항 계획 뿐만 아니라 화물의 적재 및 고박 계획 등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재 서류와 실제 선적되는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검증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결의서 MSC.380(94)를 통해 Table 4와 같이 SOLAS 제6장 제2규칙(화물정보)을 개정하였다.
컨테이너 화주는 검증된 총중량(VGM)을 운송 서류에 기재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 서류는 선장 또는 그의 대리인과 터미널 대리인에게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VGM이 서류에 없거나 관련 담당자가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될 수 없다.
3.2 적하 및 고박 계획 보완을 위한 고박 소프트웨어
CCC 9('23.9.)에서는 화물고박지침(Cargo Securing Manual) 의 컨테이너 적재 및 고박 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박 소프트웨어를 인정하도록 소프트웨어의 성능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Table 5와 같은 IMO 지침 개정이 제안되었다.
해당 제안에 대하여 CCC 10(‘24.9.)에서는 향후 2회기 동안 개정 작업을 하도록 결정되었다.
3.3 항로 지정조치
2019년 1월 1일, 북해에서 발생한 MSC ZOE호의 컨테이너 342개 유실 사고는 Wadden Islands 북쪽 항로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해역에서 악천 후가 발생하면 횡파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컨테이너선이 횡 요동을 겪고, 이로 인해 컨테이너 유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DUTCH SAFETY BOARD, 2020).
SOLAS 제5장 규칙 10(항해 안전), IMO 결의서 A.572(14), 그리고 IMO 간행물 Ships’ Routeing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역에서는 항로, 속력 등 항행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을 기반으로 North Sea에서 발생한 MSC ZOE호 사고를 고려해 Table 6 및 Fig.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Wadden Sea 해역을 항행하는 대형 컨테이너선(길이 200m 이상, 선폭 32m 이상)에 대한 새로운 항로 지정 조치가 채택되었다.
항로 지정 조치 이전에는 Northern 및 Southern Shipping Route 모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으며(Eastern 및 Western 방향 관계없이 통행 가능), 특정한 조건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에 따라, 파고가 4.5m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Northern Shipping Route를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마련 되었으며, 이 조치는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3.4 전자경사계 의무 구비 요구사항
2019년에 발생한 MSC ZOE호 컨테이너 유실 사고를 통해 심각한 횡요동을 포함한 불안정한 선박 복원성이 컨테이너 유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선박 복원성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기존에 전자 경사계의 성능 기준(결의서 MSC.363(92))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해당 기준이 강제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컨테이너 유실 및 컨테이너선 전복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IMO 해사안전위원회(MSC)는 제107차 회의에서 SOLAS 제5장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3,000톤 이상의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에 전자 경사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Table 7의 내용을 채택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7월부터 적용되어 2026년 1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3.5 유실 컨테이너 탐지 및 보고 의무
MAERSK SVENBORG호 사고 등을 계기로 컨테이너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컨테이너 유실 사고 방지를 위한 이행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CCC 1(’14.9)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MSC 103(‘21.5)에서 “유실 컨테이너의 위치 추적 및 회수를 위한 보고 및 탐지 의무 조치의 개발”이 신규 작업 과제로 채택되었고, 이를 CCC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CCC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SOLAS 제5장 제31조(위험 통보) 및 제32조(위험 통보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개정안을 Table 8과 같이 개발하여,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모든 선박이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의무 보고 사항의 형식을 표준화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컨테이너 유실이 해양 환경 오염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MARPOL 의정서 제5조(사고 보고)의 보고 절차와 관련해 컨테이너 유실 사고 발생 시 SOLAS 개정 안을 준용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MARPOL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의무 조치에 관한 SOLAS 개정안 초안은 MSC 107(‘23.6)에서 승인되었으며, MSC 108(’24.4)에서 채택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MARPOL 협약의 개정 사항 역시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0, ‘23.7)에서 승인되어 채택될 예정이다.
3.6 컨테이너 선박 복원성
IMO의 선박·설계 전문위원회(이하 SDC)는 비손상시 복원성 규칙(IS Code) 제2장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길이 100m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복원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제1세대 복원성 기준), 현재 적용 중인 제1세대 비손상 복원성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2세대 비손상 복원성 기준(Second Generation Intact Stability Criteria, SGISC)을 개발하고 있다.
제2세대 복원성 기준이 컨테이너선에 적용될 경우, 상갑 판에 화물을 적재하는 컨테이너 선박은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해 일부 화물의 적재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Chung et al., 2020).
향후, SDC는 이러한 임시 가이드라인의 경제성 및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3.7 소결
2장과 3장의 분석 결과, 기존 국제협약 및 규제 대응 조치는 선박 운항 중 컨테이너 안전을 화물 관리, 운항(복원성), 대응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대응 방안을 분류하고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① 예방 (Prevention), ② 탐지(Detection), ③ 추적(Tracking), ④ 보고 (Reporting), ⑤ 회수(Recovery).
다만, 3.5의 유실 컨테이너 탐지 및 보고 의무 규정과 같이 기존 컨테이너 해상 운송 안전과 관련되어 현재 적용 중 인 규정이나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은 발전된 기술을 고려하기 보다는 사람의 불확실한 정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유실된 컨테이너의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2차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 컨테이너 위치 정보 오인, 유실된 컨테이너의 미보고 등)
컨테이너 해상 운송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불확실한 요소를 줄여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응 단계별로 실질적인 기술적 대응방안을 고려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4. 컨테이너 유실 대응 방안
4.1 해상 컨테이너 유실의 단계별 대응방안
국제 논의동향을 분석한 결과, 해상에서의 컨테이너 유실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방안은 Fig.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실 예방, 감지, 보고, 추적, 회수의 단계로 분류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제시되며, 관련 규정 마련 시 반영되어야 한다.
4.1.1 예방단계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컨테이너가 바다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는 컨테이너의 적절한 래싱 및 고정, 컨테이너 스택의 구조적 무결성 유지, 그리고 거친 해상 조건에서 컨테이너 유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고급 선박 설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리적 및 구조적 조치는 컨테이너 유실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올바른 래싱 기술과 고박 계획을 통해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선박의 설계를 최적화하여 유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4.1.2 감지단계
최선의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컨테이너가 유실될 수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 유실을 신속하게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지 단계에서는 컨테이너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센서는 가속도 변화, 위치 변화, 그리고 기타 유실 지표를 측정할 수 있다. 신속한 감지를 통해 유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유실된 컨테이너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4.1.3 보고단계
컨테이너 유실이 감지되면 관련 당국 및 이해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 현재 SOLAS 제5장 제31조(위험 통보)에 따라 컨테이너 유실 시 의무적인 보고가 요구되고 있으나, 신속한 보고를 위해 자동 유실 보고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자동 보고 시스템은 유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관련 정보를 전파하여 모든 이해 관계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문제의 완화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4.1.4 추적단계
유실된 컨테이너를 추적하는 것은 회수 및 항해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추적 단계에서는 GNSS(글로벌 내비게이션 위성 시스템) 기술을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상에 표류하는 동안에도 유실된 컨테이너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추적 기술의 발전은 유실된 컨테이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1.5 회수단계
마지막 단계는 유실된 컨테이너를 회수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회수 작업은 정확한 추적과 신속한 보고에 달려 있다. 유실된 컨테이너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면 회수 팀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회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회수 단계에서는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회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해상 운송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추적 및 회수 단계에서는 컨테이너 내부에 장착된 GNSS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유실된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감할 수 있다.
4.2 대응 방안 관련 기술적 조치
4.1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컨테이너 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수단을 충분히 고려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의 내용에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조치에 대해 제시하였다.
4.2.1 화물관리 관점(예방단계)
앞서 컨테이너 유실과 관련된 요소 중 화물관리 관점에서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 적재·고박 보완을 위한 선박 설계 최적화는 예방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조치 중 하나이다.
컨테이너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재된 컨테이너의 고박 장치가 과적·황천·횡동요 등으로 인한 붕괴 하중을 초과한 힘을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인적 과실로 인해 잘못 계산 되어 고박된 사항들로 인해 컨테이너 유실이 발생하는 등 컨테이너 유실(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박으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유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선 선박 구조적으로 이러한 고박에 대한 위험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술 조사에 따르면, 래싱프리(Lashing-free) 컨테이너선 구조는 고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구조는 현대중공업에서 개발한 기술로, 포터블벤치라는 혁신적인 장치를 사용하여 래싱브리지와 해치커버를 제거하고, 대신 화물창 내부의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정렬해 쌓을 수 있도록 셀가이드를 갑판 위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Fig. 5와 같이 이 기술을 통해 갑판 상부에 적재된 컨테이너는 확장된 셀가이드에 의해 고정되어, 래싱 작업이 필요 없는 구조를 구현한다. 컨테이너는 셀가이드 내부에 안정적으로 배치되므로 기존 래싱브리지 구조보다 더욱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다. 이는 거친 해상 환경에서도 컨테이너의 전도나 유실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뿐만 아니라, 래싱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The Maritime Executive, 2022).
결과적으로, 이러한 래싱프리 기술은 화물 관리 측면에서 컨테이너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로 평가된다.
4.2.2 대응 관점(감지·보고·회수 단계)
2.1에서 전술한 Tipsy호의 사고 사례와 같이 컨테이너가 유실된 이후에 유실이 보고된 컨테이너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통항하는 선박 또는 컨테이너를 유실한 선박운항자 또는 선주의 보고에만 의존하는 불확실한 정보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 유실된 컨테이너의 추적·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조치 성격의 기술적 수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스마트 컨테이너 기술이 해당한다. 스마트 컨테이너 기술이란, IoT 장비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되어 해양환경의 영향과 파손, 분실 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고용량 배터리의 설치가 가능하여 컨테이너의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술이다(Kim et al., 2023).
Fig. 6과 같이 스마트 컨테이너에 탑재된 유닛에는 위치 센서, 가속도 센서, 충격 감지 센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컨테이너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추락 등의 상황을 감지하고,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한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컨테이너 유실이 발생한 경우, 선박 운항자의 자율적이고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한 위치와 시간 등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유실된 컨테이너에 대한 감지, 보고, 회수 단계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컨테이너 유실에 대한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적 수단으로 기대 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컨테이너의 해상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규정과 관련 논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주요 요소와 함께 각 대응 단계(예방, 감지, 보고, 추적, 회수)별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존 규제 체계 및 규제 논의 동향은 발전된 기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판단이나 불확실한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용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반영하여 현재 및 논의 중인 규제에 기반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술적 조치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 적인 대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예방 단계: 적절한 래싱 및 고정 기술,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는 선박 설계, 거친 해상 조건을 고려한 고급 선박 설계 등 선박 구조적 관점에서 유실 방지 기술 도입.
-
(2) 감지 단계: 컨테이너 유실을 신속히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속도 변화, 위치 변화 감지 등)를 구비하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 가능.
-
(3) 보고 단계: 유실 사고 발생 시 자동 유실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련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이해 관계자의 신속한 대응 지원.
-
(4) 추적 단계: GNSS 기반 추적 기술을 활용해 유실된 컨테이너의 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항해 안전 및 환경 보호 강화.
-
(5) 회수 단계: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한 회수 작업을 수행하여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해상 운송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지원.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글로벌 협의체에서 새로운 기술 표준을 수립하고 기존 규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 산업계가 이러한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은 적용 가능한 기술 대안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식별하였으며, 기존 규제나 논의 중인 동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방안을 모색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국내외 기술 조사를 통해 컨테이너 유실 방지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더욱 폭넓게 식별하고 이를 적용한다면, 컨테이너 유실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 이행 수단 또는 이행 모니터링 수단으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툴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