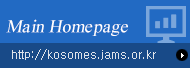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 체결 이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를 위하여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국제 운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2050년에 2008년 대비 50 % 저감하기로 한 기존 목표를 상향하여 2030년까지 최소 20%(30% 목표), 2040년까지 최소 70%(80% 목표),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탈탄소 및 탄소중립을 통한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환경규제 안을 채택하고 있다(IMO, 2023).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이고 2021년 기준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량의 약 92.8%를 수입하고 있으며, 석유 의존도는 약 38.6%를 차지하고 있다(KEEI, 2022).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이 많을수록 에너지 및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의 확보가 필요하다. 대부분 해상 운송으로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더욱 높은 연료소비율 및 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G)의 배출과 같은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Sürer and Arat., 2022). 그래서 많은 국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 개발에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해상 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수소는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자원이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저탄소 에너지 중에서 약 10~20 %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DNV, 2022).
한편, 탄소중립과 전 세계적인 수소 이용의 확산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수소의 생산비용, 수용성, 가용성, 안정성 등은 수소의 이용 확대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소의 안정성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 중의 하나이다. 수소는 공기 중에 4~75 % 농도로 함유되어 있을 때 가연성이 높고 수소-공기 혼합기는 폭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Hübert et al., 2011). 수소 관련 산업계는 수십 년 동안에 축적된 경험과 검증된 방법으로 수소의 위험성을 관리해 오고 있지만, 수소에 관한 안전 사항은 과거의 경험만으로도 부족하다. 특히 선박과 같이 제약된 공간에서 수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곤란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수소가 해운 분야의 탈탄소화 실현을 위한 연료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육상 시설에 비해 더욱 높은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소 선박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소의 잠재적 위험성을 파악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수소 안전 대책의 수립과 실현을 위한 규정의 상세화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비한 각국의 수소 안전기준 및 동향을 분석하여 수소 선박의 안전기준 개발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수소 관련 국내외 규정
2.1 국내 규정
산업통산자원부에서 2019년 12월 수소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후 2022년에「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고압가스안전법」에 근거한 고압 수소의 관리와 함께 저압 수소 안전 관리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수소 법령이 제정되면서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활용과 같은 밸류 체인(value chain)별로 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수소 선박 관련 규정은 2020년「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 선박법)이 제정되었고, 해양수산부는「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령의 제정 전인 2015년에 국내 최초의 수소 선박이 개발 및 시운전을 마쳤으나 선박의 운항, 충전 시설 및 안전에 관한 국내 법규의 미비로 인해 상용화가 더디게 되었다. 상기의 잠정기준은 임시 지침에 그치지 않고 계속 보완 및 수정하여 수소 선박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 및 표준 화함으로써 국제해사기구에서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2.2 국외 규정
국제해사기구의 해운 분야의 규제로 인해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체 연료를 사용한 선박 개발이 세계적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수소 연료를 활용한 선박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1977년 신설된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가 수소 및 연료 전지 관련 연구 및 개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수소 관련 법안에는 1990년 ‘Spark M. Matsunaga Hydrogen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 of 1990’, 1992년 ‘Energy Policy Act(EPAct) of 1992’, 1996년 ‘Hydrogen Future Act of 1996’, 2001년 ‘National Energy Policy’, 2007년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등이 있으며,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과 규정을 꾸준히 제정하고 있다 (KOTRA, 2021). 미국의 연방 규정(Regulatoions), 국가 코드(U.S. National Codes)는 아래와 같다(Molkov, 2012).
유럽은 최근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발표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육상 및 해상 신재생에너지, 전기 분해 및 연료 전지, 탄소 포집 및 저장 등의 기술을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은 유럽 수소 은행(European Hydrogen Bank)을 설립하여 유럽을 수소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려고 많은 기술과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재생 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가스 규정 및 지침(Gas Regulation and Directive), 대체 연료 인프라 규정(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 연료 품질 지침(Fuel Quality Directive) 등을 마련하여 EU 내의 재생 에너지 비중에 목표, 저탄소 연료의 기준을 제시, 수소 충전 인프라 기준 제시, EU 내 육상 운송에 사용되는 연료의 품질 요건 등 을 마련하고 있다(KOTRA, 2023). 중국은 2004년부터 2005년 수소 경제 비전 및 로드맵을 제시(Yuan and Lin, 2010)하였으 며 2019년부터 수소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및 인프라 조성 등과 같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Li et al., 2022) 그리고 중국 정부는 2021~2035년을 포괄하는 중국 최초의 수소 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NDRC, 2022). 2020년 4월 국가에너지국 (NEA)은 수소를 ‘중국 에너지법’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편입시켜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고압가스보안법」,「도로운송차량법」, 「도로 법」, 「소방법」,「건축법」,「전기사업법」의 6개 법규와 28개 항목이 연료전지 관련 법률로 마련되어 있으며 차세대 연료로 수소와 암모니아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의 신규 법안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Table 1은 북미, 유럽, 일본 등에서 수소 기준 개발과 관련된 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수소와 관련된 규정, 코드 및 표준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점차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데, 이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때 위험 수준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Kumar et al., 2023).
수소 안전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국제 법규의 종류는 많이 제정되어 수소를 연료로 규정하지만, 여전히 위험물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수소가 선박 연료로 사용되기 위하여 많은 시스템과 규정들이 정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TC)는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 시스템, 인프라와 관련된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Table 2와 같이 수소와 관련된 여러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ISO/TC 197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측정 및 사용을 위한 시스템과 장치의 표준화를 다루고 있다. ISO의 많은 규정이 개발되고 있으나 수소연료전지 선박과 관련된 규정이나 기준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대부분 연료 전지 차량 관련 규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의 확대 및 보급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기준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는 전기 및 전자 분야에서 국제적인 표준을 개발하는 기구이다. IEC에서 제공하는 수소 관련 규정은 수소와 연료 전지 기술에 대한 안전 및 성능과 관련된 IEC 62282,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에 대한 설계,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안전 지침은 IEC/TR 62282-7-1, 폭발성 환경에서 수소 시설에 대한 전기적 설비와 관련된 안전 사항은 IEC 60079-29-2 등 이 있다.
3. 수소 선박 관련 안전기준 개발 동향
3.1 수소 연료 전지에 관한 안전기준
국내에서 적용되는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안전기준으로는 대표적으로 KGS Code가 있다. 이 코드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이다.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코드에는「고정형 연료 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H371),「이동형 연료 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373),「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U671),「가스용 연료 전지 검사 기준」(KGS AB934)이 있으며 연료 전지 설치기준으로는 KGS FU551, FU431, FU432, FU433 등이 있다(KGS Code, 2023).
연료 전지의 선박 적용에 관한 지침으로는 KR(한국 선급)에서 개발한 선박용 연료 전지 시스템 지침(2022)이 있으며, 연료 전지 전력 설비의 설계 원칙, 화재 안전, 전기 시스템, 감시 및 안전장치, 연료 전지 관련 보기, 제조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KR, 2022). 특히 각국 선급의 기술 규칙은 법규정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국제협약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용하여 제․개정하고 있다. Table 3은 연료 전지에 관한 국내외 코드 및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IEC 62282-3-100, IEC 62282-3-200, IEC 62282-3-201은 고정형 연료 전지 성능 및 안전 관련 기준이고, 일본도 이를 도입하여 JIS C 62282-3-100, JIS C 62282-3-200, JIS C 62282-3-201으로 표준화하였다. IEC 62282-3 series에는 일산화탄소(CO) 및 수소 등의 배출 가스 농도 제한, 연료 전지의 화재 및 폭발 위험 방지, 환기되는 실내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의 작동 검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은 국가마다 EN 50465 기준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데, 이 기준은 공칭 열 입력량이 70kW 이하인 연료 전지에 적용 되며 작동 안전성 및 효율성, 전기적 요구 사항, 작동 지침 등의 항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KSC 8569에서 연료 전지 시스템을 다루고 있으며 KGS AB 934(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Gas Fuel Cells)에서는 검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동형 연료 전지에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Fuel Cell Power system은 IEC 62282-4 series, portable fuel cell은 IEC 622852-5 series, micro fuel cell은 IEC 62282-6 series에서 구분하여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분류로 안전(safety), 성능(performance), 기타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다(Choi and Lee, 2021). 친환경 연료의 개발과 활용에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등장한 코드가 IGC Code 및 IGF 코드이다.
IGC Code(The International Code for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는 액화가스 산적운 반선의 건조 및 설비에 대한 국제 코드이며, IGF Code(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는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 코드이다. 이 두 코드는 각각 액화가스 화물 운송과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의 사용에 대한 안전 사항을 다루고 있다. IGC Code는 1983년 IMO에서 신조선에 대한 요건으로 최초로 채택한 이후에 2016년 산적 액체 수소 운송에 관한 안전규정의 잠정 지침(Res.MSC.420(97))으로 채택 하였다. IGF Code는 IGC Code를 적용받는 선박을 제외하고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국제 표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현재 수소와 같은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의 사용과 관련된 기준은 이 코드와 관련성이 높다. 이 코드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선박이 등장하면서 2009년에 IMO에서 ‘가스 연료 선박의 안전에 대한 잠정 지침’을 개발하고 IGF Code 개발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에 이 코드는 2015년에 채택되었고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국제항해를 하는 500톤 이상의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선박은 이 코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 두 코드는 지속적으로 재․개정 작업을 통하여 친환경 선박의 안전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KR, 2021).
한편 해양에서 사용되는 연료인 수소는 IGF Code의 범위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소 연료 전지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수소가 차기 에너지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으므로 충분한 규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IMO는 해양에서 연료로의 수소 사용, 액화 수소의 장거리 운송, 액화 수소 벙커링 선박에 관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ABS(미국 선급)는 선박용 연료 전지 사용을 위한 시스템의 설계, 평가 및 구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해양 및 해양 응용 분야용 연료 전지 전력 시스템에 관한 지침서를 발행하였다(ABS, 2021).
3.2 수소 저장 시설에 관한 안전기준
수소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나 액체로 변환시킬 수 있다. 그래서 수소는 기체 또는 액체로 저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소를 저장하는 시설에 관한 안전기준으로는 KGS FP 216, KGS FP 217이 있는데, 주로 저장식 및 제조식 수소 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저장 시설의 배치 기준에서는 보호시설과의 거리, 화기와의 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저장 설비 기준에서는 저장 설비의 재료, 구조 및 저장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Table 4는 보호 시설과의 안전거리를 나타낸 것으로서 수소 저장 설비 및 처리 설비와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저장 시설과 선박에 설치되는 수소 저장 시설에 관한 안전기준은 이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차량용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KGS Code, 2018a;KGS Code, 2018b;KGS Code, 2021).
한국선급은「가스연료선박 지침(2016)」을 개발하여 2016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가스연료 선박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는 연료탱크의 배치, 액화가스연료 격남 및 격납 설비의 안전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KR, 2016).
Table 5는「가스연료선박 지침(2016)」에서 제시하는 연료 탱크의 배치에 관한 것으로서 수소 저장 탱크가 설치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액화 수소 안전기준과 관련된 기준에는 KGS AC111, AC118(저장 탱크 및 압력 용기 기준), KGS AC212, AC419(운송용 저장 용기 기준), KGS AC213(초저온 용기 제조 검사), KGS AA311-316(용기 부속품 제조 검사 재검사), KGS AC111-116(저장탱크/압력용기 검사 재검사), KGS FU111(고압가스 저장시설 검사) 등이 있다. 국외 기준으로는 CGA H-3(액화가스 저장 탱크 제조), EN13445-3(불연성 압력 용기), IGCDoc77/01/E(과충전시 극저온 탱크 보호), IGCDoc114/03/E(고정된 극저온 용기의 작동), EIGA Doc.06/19(액화수소 저장, 취급 및 공급의 안전성), IGCDoc/03/E(극저온 액체 용기에 대한 안전성 특성), ISO21013(극저온 용기 규격), ISO21010(극저온 용기 호환성), ISO21009(고정된 단열 극저온 용기), ISO13985(수소 연료 차량 탱크), ISO21029-1(1,000L이하의 운반 가능한 진공 절연 용기) 등이 있다(Kim et al., 2021).
3.3 수소 충전 시설에 관한 안전기준
수소 충전 시설은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압축기, 저장설비, 배관, 충전 설비 등의 제반 시설을 의미한다. 수소를 선박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 시설이 항만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선박용 액화 수소 충전 시설은 액화 천연 가스 충전 시설과 유사할 것이며, LNG 벙커링 시설 보다 자본 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ABS, 2021b).
한편 현재 개발된 수소 충전 시설과 관련된 안전기준은 대부분 수소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고 수소 선박의 벙커링을 위한 충전 시설에 관한 안전기준 개발은 미비한 상태이다. 수소 충전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법규에는「고압가스 안전 관리법령」,「건설산업기본법」,「건축법」,「한국가스안전공사」KGS Code,「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9호 융․ 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등에 관한 특례기준 등이 있다. Table 6은 북미와 ISO 수소 충전 시설 관련 기준 및 코드를 나타낸 것이다. 수소 충전 시설의 규모별로 충전 빈도, 시설의 설치 면적, 경제성, 성능 규격에 관한 사항 및 인화성 또는 폭발성 혼합물의 형성을 방지하고 점화원 및 수소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방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은「고압 가스 안전관리법령」및 KGS Code(FP 216, FP 217)에서 제시하고 있다(ME, 2021). 한편, 항만 내에 설치할 선박용 수소 충전 시설에 관한 안전기준은 더욱 엄격한 수소 충전 시설 설계 기준, 화재․폭발 방지 기준을 마련하여 항만 물동량 처리와 같은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소 선박 안전기준 개발 시 고려사항
4.1 누출 및 화염 경보 시스템에 관한 기준
수소 선박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안전 사항은 수소가 누출되어 발화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다. 누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서도 누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출이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수소 흐름을 차단하고 외부로 배출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수소의 물리적․화 학적 특성으로 인해 누출이 발생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어야 누출 사고의 확산을 줄일 수 있다.
수소의 누출은 주로 밸브류 및 배관 연결부에서 주로 발 하므로 수소의 분출 속도와 관계없이 수소 농도가 연소 하한계인 4% 미만에서도 누출 수소를 감지하는 감지기(detector)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염도 감지할 수 있는 수소 화염 감지기도 설치되어야 한다.
수소의 누출량과 화염 발생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Table 7과 같이 수소 누출량에 따른 즉시 및 지연 점화 확률이 달라진다. 즉시 점화하는 경우의 경우는 제트화재를 발생시키고, 지연 점화는 증기 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다(Kang and Lee, 2022). 수소 누출이 선박 내부와 같은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면 즉시 점화의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소 누출 및 화염 경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4.2 환기 시스템에 관한 기준
수소는 고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다루는 설비는 설계 과정에서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수소가 누출되면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더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소의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환기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선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환기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지침」,「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에 국한되어 있는 정도이다. 상기 지침과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환기에 관한 내용은 수소 누출에 대비하여 ‘시간당 최소 30회 이상의 환기 능력을 갖는 부압식의 기계적 통풍 장치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소의 연소 하한계에 도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모든 구역의 충분한 공기 순환이 되도록 하여 수소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수소 성층화 (stratification)는 수소로 인한 화재와 폭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소충전소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에서도 누출된 수소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환기를 위해 충분한 면적을 가진 2방향 이상의 개구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환기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KOSHA GUIDE, 2021).
따라서 환기 시스템에 관한 기준에는 환기구와 배기구 위치, 환기 구역 설정, 환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더 세분화하여 규정해야 한다.
4.3 폭발 피해 방지 시스템에 관한 기준
수소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화재로 인해 수소 폭발이 확산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래서 수소 누출로 인한 폭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폭발 위험성이 있는 구역에 방폭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선박이 해상에서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상세화하여 수소 선박을 건조할 때 설계 기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able 8은「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서 폭발로 인한 과도한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발췌한 것이다. 수소 폭발이 발생하더라도 선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폭발에 대비한 안전 요건, 설계 요건, 시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5. 결 론
수소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안전기준 개발은 실무 규정에서 법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개발된 수소 안전기준은 육상 시설에 국한되거나 제한된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수소 관련 하위 산업 분야까지 연계된 것도 있다.
수소 선박에 관한 안전기준의 부재는 해운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수소 선박 안전기준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안전기준의 개발은 수소 이용에 관한 규제로써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소 이용을 지원하며 내·외재적인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수소 관련 규정들의 수집 한계성도 있었고 명문화한 규정들의 포괄적․세부적 사항 등을 모두 언급할 수는 없었다. 이는 수소 선박이 상업화를 위한 건조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정들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수소 선박과 관련하여 제․개정된 법률, 규정, 기준, 코드 등을 수집하고 한계점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안전기준 개발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선박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용화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IMO의 국제적 환경 규제는 계속 엄격해지고 있으며 수소 선박에 관한 기술적 선점이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울산에서 수소 선박에 관한 시운전을 시행하였고 수소 항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소 선박과 수소 선박 충전소 안전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수소 선박의 발전에 취약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각국마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발표 및 시행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소비 및 활용에 이르는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수소 항만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태이다.
국내의 액화수소 플랜트 및 액화수소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선박 항해에 연료로 사용될 수소는 압축가스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액화 상태가 더 많은 연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액화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액화수소의 확산 보급을 위해서라도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액화수소 안전 기술 및 안전 기준 개발이 중요한 것이다. 또 차량용 수소충전소도 2023년 기준으로 약 253여 곳으로 일본, 미국, 독일에 비해 확충 속도가 빠르지만, 수소 차량을 최초로 상용화한 국가로서 수소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수소 선박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안전기준을 제․개정하여 수소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조선 강국으로의 위치를 지키고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구축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향후 IMO의 규제나 국제 기준의 개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