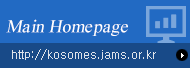1. 서 론
정부는 2024년 2월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비방안은 실효성이 낮거나 유사, 중복 인증을 통합, 절차간소화 등 중소기업의 부담완화가 주된 내용이다(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prime minister’s secretariat, 2024).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에 유출된 기름 등의 해양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회수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제자재·약제가 사용되며 종류는 총 5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제자재에는 오일펜스, 유흡착재가 있으며, 방제약제에는 유처리제, 유겔화제, 생물정화제제로 구분된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품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고, 제품을 판매할 때 마다 검정을 시행하는 엄격한 사전규제를 해왔다(Jang et al., 2023). 이와 같은 사전규제는 정부의 인증규제 정비방안과 같이 국민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23년 12월 불필요한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 제도 폐지를 포함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정 제도를 폐지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거검사, 제품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시장의 규모와 해양환경의 특수성 및 제조업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및 검정 개선방안으로 정기검사, 시장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Jang et al., 2023).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검정 제도의 역할을 대체하고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후관리 중심의 합리적 제도를 목표로 하고자 한다. 현 제도의 실태 파악 및 국내·외 주요 제품 인증제도 조사를 통해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사후관리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 제도의 절차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를 할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하고 통과 후, 해양경찰청에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형식승인 받은 제품을 판매시 마다 성능시험 보다 간소화된 검정을 받게 된다. Fig. 1에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제도의 절차를 나타냈다(Korea Coast Guard, 2021).
2.2 형식승인 및 업체 현황
2023년 기준 해양경찰청에 등록된 방제자재·약제의 제품수는 총 149개 사의 421종 이며, 이중 오일펜스가 165종, 39.2 %, 유흡착재가 206종, 48.9 %로 전체의 88.1 %를 차지 하여 2개 품목의 제품 수가 가장 많다. 약제는 유처리제 7.1 %, 유겔화제 2.6 %, 생물정화제제 2.1 %로 전체의 11.9 %로 수요가 적은 만큼 제품 수도 많지 않았다. Table 1에 2023년 기준 업체별, 품목별 형식승인 현황을 기술하였다(Korea Coast Guard, 2024). 형식승인을 받은 전체 149개 업체 중 19개(12.8 %) 업체만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Korea Coast Guard Research Center, 2023).
2.3 성능시험 및 검정 현황
Table 1을 보면, 최근 3년(‘21년~’23년) 동안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은 76건, 검정은 435건으로 판매할 때마다 받게 되는 검정 건수가 대부분이다.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겔화제와 생물정화제제를 제외한 유흡착재, 오일펜스, 유처리제 3개 품목만 성능시험과 검정을 받았다(Korea Coast Guard Research Center, 2023).
2.4 검정제도의 문제점
최근 정부의 인증규제 정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의 측면에서 제품 판매 시 마다 검정을 받는 것은 이중 규제이다. 특히, 방제자재 및 약제의 시장규모가 작아 주문제작 방식으로 소량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 받은 제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 1회 성능시험을 통과하면 검정시험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서 기준 미달 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검정이 제품의 품질 전체를 보증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정은 전수검사가 아닌 일부 제품에 대해 일부 항목만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품 하자를 전부 확인할 수 없음에도 업체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다.
성능시험과 검정의 평가 항목을 비교하여 Table 2에 나타냈다. 오일펜스는 접속부 재질, 인장강도, 내유시험, 내후시험, 유흡착재는 온도시험, 진탕시험, 강도시험, 인장시험, 유처리제는 인화점, 동점도, 생물영향시험(2타입), 색 등이 검정에서 제외된다(Korea Coast Guard Notice No. 2021-6, 2021).
3. 국내 사후관리제도 고찰
국내에서는 25개 부·처·청에서 257개 법정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주요제품 법정인증제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비교하여 Table 3에 표기하였다.
3.1 전기용품, 생할용품
법정의무인증으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한 제품 안전제도로 KC(Korea Certification)마크를 사용한다. 안전인증 제품의 사후관리는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포함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operation instructions Act, 2023). 매년 중점관리대상 세부품목을 포함한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operation instructions, 2021). 사후관리로 시장감시를 통해 불법 및 불량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위해정보를 수집하는 제품안전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절차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침을 마련하고 민간기관,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안전모니터 링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유통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하고 위해(危害)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Product safety information center, 2014).
3.2 방송통신가지재
법정의무인증으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위해의 우려, 전자파의 영향 등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제도로 KC마크를 사용한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
국내에서는 전파법제58조의2에 의거하여 위해도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3종류로 구분된다(Radio Waves Act, 2024). 인증유효기간은 없으며, 매년 전년도 대상기자재의 3%를 선정하여 표본검사를 시행한다(Public notice on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testing laboratorie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 etc, 2024). 사후관리 기능으로 적합인증, 적합등록 제품에 대하여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적부판정에 따라 시정명령, 판매중지,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하고 있다(Public notice on conformity assess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 etc, 2023).
3.3 식품 및 축산물
식품위생법 제 48조(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법정 의무인 증으로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마크를 사용한다(Food Sanitation Act, 2024a).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최초인증과 동일한 재심사를 실시한다(Food Sanitation Act, 2024b). 식품의약품안전 처는 2023년 소규모 HACCP 적용업체 지원전략으로 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다. 사후관리 기능으로 매년 1회 이상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평가점수에 따라 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등 차등관리를 실시하고 있다(Food and livestock product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standards, 2023).
3.4 소방용품
소방용품 형식승인은 KC마크를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통해서 유지여부를 결정한다(Act on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irefighting systems, 2023a). 품질 제품검사는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한 주기마다 1회씩 실시한다(Rules regarding quality control of firefighting appliance, etc, 2023a). 또한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수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Act on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irefighting systems, 2023b). 사후관리로 소방용품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불량 소방용품 유통방지를 위해 매년 소방용품 수집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검사를 실시한다(Rules regarding quality control of firefighting appliance, etc, 2023b). 년 2회 실시하며 민원이 발생한 품목과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품목을 선정하고 매년 소방용품 수집검사 계획을 수립한다(National Fire Agency, 2018).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 발생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취소와 수거· 폐기 명령이 내려진다(Act on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irefighting systems, 2023c).
3.5 KS인증 제품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인증 제품의 사후관리는 3년 주기의 정기심사, 1년 주기의 공장심사와 정부에서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판품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KS Certification Agency Council, 2017). 이 중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는 KS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단체 등의 민원발생 또는 인증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 실시한다(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2022a). 시판품 조사건수는 대상건수 대비 3~5%의 비율로 실시하고 있다(Public data portal, 2022).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제품의 품질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할 경우,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KS인증을 취소 할 수 있고, 산업표준화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명령, 표시제거, 판매정지, 제품 수거를 명할 수 있다(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2022b).
4. 국외 사후관리제도 고찰
방제자재·약제 인증제도와 그 외 EU,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주요 제품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4.1 방제자재·약제 인증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미국은 방제작업에 사용가능한 품목을 국가긴급계획에 등록하여 공개하며, 제품의 시험결과를 고지하는 단순 제품등록 형태로 특별한 사후관리는 운영하지 않는다. 영국과 호주는 제품 사용전 승인절차가 필요하며, 인증유효기간은 5년이다 (Jang et al., 2023).
4.2 EU의 CE 인증제도
유럽 국가 간 통용되는 CE(Conformite Europeen)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을 만족한다는 의미로 CE마크를 부착하면 EU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06b). CE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없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3~5년의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사후관리 주기는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장심사가 진행된다. 기준미달 제품은 수거, 시판금지, 사용금지 등 제반조치가 취해진다. CE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으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고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위반 시 벌금, 제품회수 및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Korea Standard Quality Laboratories, 2013).
4.3 미국의 UL인증제도
미국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은 1894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인증기관이다(Certification Mangement Support Center, 2024). 전기·전자·소방·건설자재 등의 UL표준이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통용된다(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06c). 별도의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후관리 심사로 인증을 계속 유지할수 있다. 사후관리는 제조제품의 공장심사로 완제품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실시하며 규격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International Certification Center, 2005).
4.4 독일의 인증제도
TUEV(Technischer Ueberwachungs-Verein)는 독일의 대표적인 민간 공인 시험기관으로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다양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후관리로 TUEV에서 인증서를 받은 제품의 경우, 품질 유지 확인을 위해 1년에 한번 씩 샘플 검사 및 공장 실사가 행해지며, 인증서 효력이 끝나는 5년 뒤에는 특별 검사가 실시된다(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06b).
또한 DIN(Deutsche industrienorm)인증제도는 독일 국가표준 인증으로 사후관리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나 심사 주기는 제품에 따라 다르다. DIN EN ISO 9001에 따른 품질시스템 및 검사설비, 검사절차를 실시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검사결과 처분으로 인증취소 외 행정처분 사항은 없다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6).
4.5 프랑스의 NF인증제도
프랑스의 NF(Norme Francais)인증제도는 국가표준인증으로 사후관리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인증획득 후 제품마다 다르지만 인증서 발급 6개월 후 또는 년 1회의 공장 수시 감독 및 샘플링 검사를 시행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인증취소 외 별도의 정부 행정처분 사항은 없다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6).
4.6 일본의 JIS인증제도
일본의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인증제도는 국가표 준인증으로 인증서 발급 6개월 후 또는 년 1회의 공장 수시 감독 및 샘플링 검사를 시행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3년에 1회 이상 정기 인증유지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인증의 취소, 사용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비정기 사후관리제도로 시판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를 통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6).
4.7 싱가포르 인증제도
싱가포르의 대표적 인증제도는 소비자 보호 등록제도로 안전검사당국(Safety Authority)에 의해 통제물품(controlled goods)으로 지정된 품목은 안전검사를 통과하여 당국에 등록된 이후에 싱가포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주로 전자제품, 전기 용품 등이 대상이다. 사후관리로 유효기간 3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검사후 승인이 되면 유효기간 3년이 연장되고, 안전검사당국은 규정대로 승인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동 제품의 승인 만료 즉시 등록을 말소한다(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06a).
5. 방제자재·약제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고찰
5.1 제도 방향성
국내 인증제도의 대부분은 정기검사와 매년 제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기검사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연1회 이상 제품검사를 실시해서 인증 유지여부를 결정하며,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유통 중인 제품조사,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최초 인증심사 또는 정기심사 시의 품질 수준이 상시 유지되고 있는가를 점검함으로써 유통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도 국내 인증제도와 유사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사후 관리의 목적은 생산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신뢰도 있는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내·외 주요 인증제도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고(Amendments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2023), 유효기간 종료전 재인증을 위한 전체항목의 성능 시험을 포함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둘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시 검사주기, 제품 수집 방법, 검사항목 등의 세부내용의 설정 등 방제자재· 약제의 시장 유통 현황과 각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인증기간 동안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집검사와 현장검사를 포함한 시장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
5.2 사후관리제도 방안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검사제도에 대 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5.2.1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정보시스템 구축
방제자재·약제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시스템에는 물품별 시장 유통 현황, 업체현황, 물품별 형식승인의 유효기간, 정기검사 관리를 위한 정보, 검사결과, 행정처분 현황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해양 오염방제 자재·약제 정보시스템의 흐름도 및 포함하여야 할 기능을 Table 4에 표기하였다.
5.2.2 유통중인 제품의 수집검사
유통 중 제품검사의 장점은 시장 감시를 통한 기업의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검정 폐지를 보완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오히려 규제 강화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과 예산 및 범위 등 의 문제로 관리의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품목별 검사항목은 현재 공인시험기관이 해양경찰연구센터가 유일하고 다양한 검사기관 선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성능 시험 전체 항목이 아닌 현 검정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이 때 제외된 항목은 정기검사(재인증)시 시행하는 정기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방법 및 절차로 시장 유통 판매 중인 제품을 정부예산으로 구입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해당 제품의 품질 수준을 측정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의 보장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통제품의 표본조사는 비밀유지가 중요하나, 현재 방제자재·약제 생산 업체가 영세하고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정된 판매처로 인한 비밀유지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방제자재·약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에 방제자재·약제 비축물품 납품시 일부를 선정하여 샘플링을 시행하는 방안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집검사 품목 선정의 합리화를 위해 매년 해양오 염방제 자재·약제 수집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조사범위 및 품목별 수집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 주요 인증제품의 시판품 검사 비율은 대상 제품의 3~5%이다. 이를 바탕으로 예로 방제자재 및 약제의 검사수량을 10%로 산정한다면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오일펜스는 3년 평균 6개사 58건으로 수집 수량은 6건, 유흡착재는 8건, 유처리제 4건으로 총 18건이 1년 수집검사 수량으로 산정될 수 있다. Table 5에 최근 3년 품목별 유통 현황 자료를 표기 하였다. 그리고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불량률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관리대상 제품으로 지정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5.2.3 수집 불가 제품에 대한 방안
오일펜스는 중량이 40 kg 이상, 길이가 20 m 이상으로 크고 무겁다. 또한 유흡착재, 유처리제와는 다르게 샘플 일부를 채취할 수 없어 검사가 쉽다 않다. 특히, 오일펜스 C형은 대부분 고가의 해외 수입제품이며, 회수장치와 세트로 공급되기 때문에 예산, 수거, 운반 등의 문제로 유통 제품의 수집 검사가 어렵다.
최근 3년 오일펜스 C형은 1년 평균 3건 정도로 소량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항목을 제외하는 것보다는 평상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오일펜스 C형의 제품 납품일을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방안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2.4 시장감시 모니터링
불량제품의 수시 단속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검사를 포함한 시장감시모니터링 기능도 필요하다.
방제자재·약제의 주 소비층은 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 해군, 방제업체, 해양시설 등으로 유통제품의 현장검사 및 샘플수거는 일선 해경서의 해양오염감시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선박·해양시설 대상 특별점검 기간에 보관된 방제자재·약 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샘플링을 통해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모니터링 평가 항목은 검정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생산업체와 시험기관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거라 판단된다. 단속 후의 검사결과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타 검사결과와 함께 관리한다.
평상시 제품의 문제점 등을 즉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가 참여하는 시장감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면 사후관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5.2.5 행정처분
국내외 주요인증의 사후관리 후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부분 크게 개선권고, 인증취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선권고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기준 미달 내용이 다소 경미하여 표시정지, 판매정지, 회수, 교환, 개선명령 등이 해당된다. 인증취소 사유는 인증과 관련하여 중대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인증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회수·교환·폐기·판매정지 등 의 처분을 받고도 일정기간 내 시정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될수 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제도의 현 제도와 개선된 효율적인 사후관리제도를 비교하여 Table 6에 기술하였다.
6. 결 론
정부는 22년 12월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할수 있도록 불필요한 인증제도 폐지, 인증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2).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에서 검정을 폐지를 결정하고 사후관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제품 인증제도를 비교하여 해양 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사후관리 방향을 제안하였다. 형식 승인 후 정기검사, 제품수집검사, 현장검사, 시장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행정처분 기능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기존의 검정제도를 대체할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도 수행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변화의 시점에 맞춰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성능시험 일부항목 등의 개정이 요구된다.